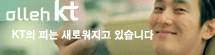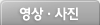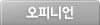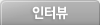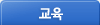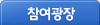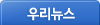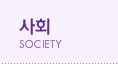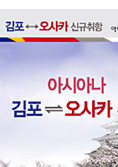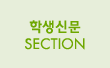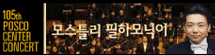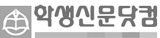입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수능과 내신 성적 등 학력점수 위주의 입시제도에서 `입학사정관제도'라는 새로운 입시전형을 대학들이 속속 선택하고 있다.
연세대(1309명) 한양대(1031명) 고려대(886명) 한국외대(678명) 성균관대(626명) 등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울산과학기술대의 경우 정원(750명)의 80%인 600명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조선대, 울산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입학사정관제도란 그동안 점수 위주의 선발이 아닌 학생의 잠재력과,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 대학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채용, 이들이 학생의 잠재력 등을 평가하고 또한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일선 학교로 찾아가 우수학생 발굴에도 나서게 된다.
그동안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수위주의 대학입학 전형에서 탈피한다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모두가 국·영·수 등 교과과목만 잘 하는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다양성을 통해 교과과목이 아닌 개개인의 소질을 중요시하고 그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들도 만족 할 수 있고, 교육의 제공자인 학교와 교사들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입학사정관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확보의 문제다. 입학사정관들이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로 학생을 평가하게 된다.
물론 입학사정관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이유로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겠지만 그 평가 자체가 주관적이다 보니 하나의 기준을 잡지 않는다면 입학시즌마다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입학사정관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교육학을 전공한 석·박사 급 인력으로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을 채용하고는 있지만, 학생 개개인의 특기, 적성,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 대학마다 10여명도 안되는 입학사정관들로 가능할 것이냐 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다음으로는 입학사정관제도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 뽑히고 있는 공교육 강화라는 측면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는 점이다.
사교육시장은 오히려 입학사정관제를 반기는 분위기다. 입시가 점수가 아닌 복잡한 형식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 빠른 사교육 가는 벌써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새로운 입시교육을 만들어 내고 있다.
결국 입학사정관제도 역시 사교육이라는 암덩어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여러 분야의 사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일부 지역의 학생들이 결국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도 있는 것이다.
결국 입학사정관제는 두개의 칼날과 같다. 도입취지와 같이 학생들의 잠재력 등을 평가하고 학생들이 단순히 성적만으로 입시를 치루지 않게 된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지만 제도의 시작이 지금과 같이 미비하다면 결국 우리 입시는 또 다시 후퇴를 거듭할 것이기 때문이다.